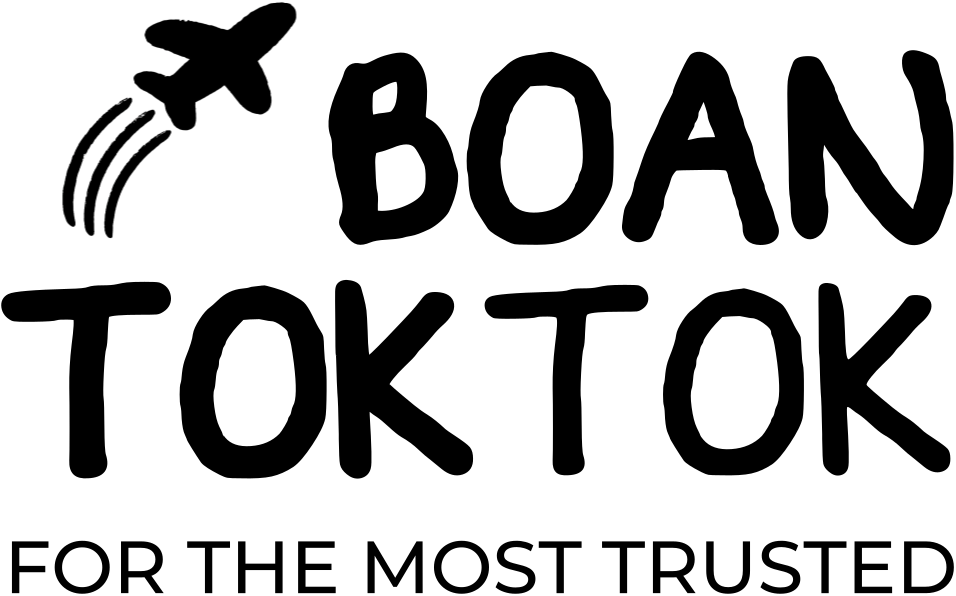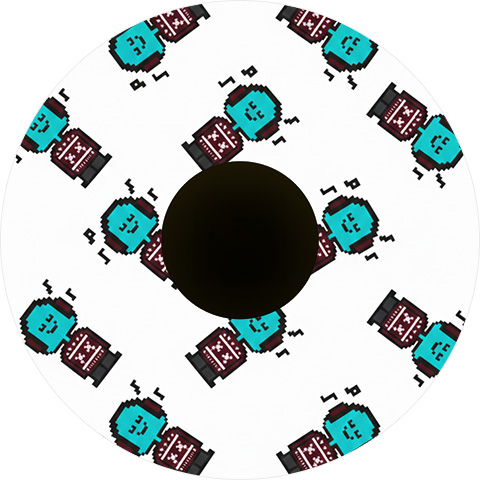함께보안
현장르포
울타리의 눈물,
두 번째 이야기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공항을 지키는 사람들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는 2025년 겨울, 인천국제공항의 끝자락은 여전히 바쁘지만 어딘가 쓸쓸하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인천국제공항 외곽사업소의 겨울 근무는 어느새 또 하나의 계절을 견디는 일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설렘으로 공항을 찾는 이 시기, 그 설렘이 안전하게 떠오르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눈보라 속에서 맞는 근무
외곽지역의 새벽은 유난히 어둡고 조용하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칼바람을 가르며 출근 차량이 하나둘 통제초소를 향해 모인다.
두꺼운 방한복에 목도리를 둘러도 근무지에 내리면 첫 숨부터가 차갑다.
얼굴은 금세 얼얼해지고 장갑 안 손가락마저 굳어 오지만, “오늘도 사고 없이 끝내자”는 말 한마디에 몸을 다시 일으킨다.
외곽사업소 직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겨울이 반갑다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그 누구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
돌아가는 비행기, 떠나는 사람들, 도착을 기다리는 가족들, 공항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 뒤에 자신들의 하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터미널 밖, 또 다른 공항
터미널 안은 조명과 안내방송,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그러나 통제초소 앞은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다.
설렘 대신, 묵묵히 줄을 선 상주직원과 작업자들의 하얀 입김만이 겨울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안요원들은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 출입등과 작업계획서를 받고 차량을 천천히 살핀다.
추위가 사무치지만, 검색 동작 하나하나에 힘을 풀 수는 없다.
작은 허점 하나가 전체 안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초소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이 작은 문 하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하루 종일 바람을 맞고 서 있다.
공항 안전을 위한 마지막 관문,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체온으로 이곳은 버티고 있다.


미끄러운 겨울을 달리는 순찰팀
눈 소식이 들리는 날, 외곽 차량순찰팀의 표정은 더 무거워진다.
공항을 감싸는 보안도로 대부분은 좁고 굴곡이 심해 제설차가 들어오지 못한다.
눈이 쌓이고 얼음이 잡히면, 그 길은 어느새 ‘조심’이 아니라 ‘긴장’을 강요하는 구간이 된다.
순찰 차량 운전자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쉽게 힘을 놓지 못한다.
가벼운 미끄러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커브 하나를 돌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뛴다.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눈 덮인 울타리와 활주로,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항공기를 바라보며 순찰차량은 멈출 수 없는 그들만의 항해를 이어간다.
눈보라를 뚫고 구역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타이어 자국만이 새로 생긴 발자국처럼 눈 위에 남는다.
그 흔적은 그날 누군가가 그 길을 지켰다는 조용한 증거가 된다.

보이지 않는 자리, 지워지지 않는 책임
외곽사업소의 근무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사진에도, 기념식에도 잘 담기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가 흘러간다.
무전으로만 주고받는 짧은 말들, 출입기록에 남는 몇 줄의 숫자와 메모, 보고서 한 장으로 압축된 그들의 하루 뒤에는 체감 온도 영하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근무를 마치고 초소를 나설 때면, 환하게 웃는 여행객 대신 거칠어진 손과 얼룩진 방한복만이 남는다.
그래도 그들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볍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말이 이들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하루의 결산이기 때문이다.


가장 바깥에서, 가장 안쪽을 지키는 사람들
인천국제공항의 외곽은 지리적으로 가장 바깥에 있지만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쪽에 서 있는 곳이다.
외곽이 멈추면 공항의 모든 순기능이 멈추게 된다.
이곳을 통해 출입하는 상주직원과 작업자, 물자와 장비, 정비를 마치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항공기 등 수많은 움직임이 오늘도 외곽사업소를 통해 안전하게 이어진다.
항공기가 밤 늦게 마지막 이륙을 끝내고 터미널 불빛이 줄어들 때에도 외곽의 불빛과 무전 소리는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곳을 ‘외곽’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이곳을 지키는 것은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도, 눈발이 얼굴을 때리는 밤에도 이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과 역할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겁게 공항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터미널의 화려한 불빛과 여행객들의 설렘 뒤에 묻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낸 오늘 덕분에 수많은 여행과 공항의 운영이 아무 일 없이 시작되고, 무사히 끝난다.
그 사실 하나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도 이들을 다시 살을 에는 근무지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된다.